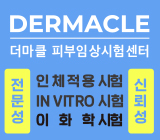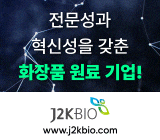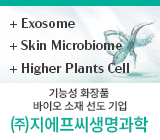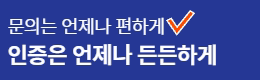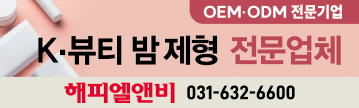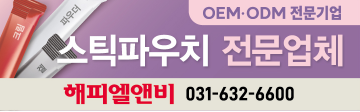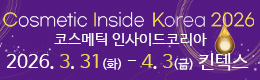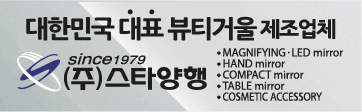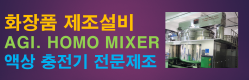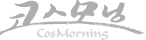WWD 발표 ‘The 2024 Top 100 Beauty Companies’

지난해 전 세계 화장품·뷰티 매출 상위 100곳 기업의 총매출은 2천520억8천650만 달러(한화 약 343조 원)를 기록, 전년도의 2천449억8천510만 달러 보다 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프랑스(13기업)가 744억2천580만 달러로 2023년에 이어 1위를 고수했다. 13곳의 이들 프랑스 기업이 올린 매출은 전년도의 712억8천850만 달러보다 4.4%가 증가한 수치다.
미국은 2023년보다 100위 권 내에 진입한 기업이 2곳 줄어들어 30곳의 기업이 685억4천970만 달러의 매출과 2.6%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위를 지켰다.
뒤를 이어 △ 영국(4곳·285억4천700만 달러·2.2%) △ 일본(11곳·168억6천650만 달러·-3.9%) △ 독일(4곳·141억2천630만 달러·5.4%) 등이 지난해와 같이 3위~5위 권을 유지했다.

이같은 내용은 미국 화장품·뷰티·패션 전문 미디어 WWD가 발표한 ‘The 2024 Top 100 Beauty Companies’ 최신 리포트를 코스모닝 편집국이 입수해 분석한 사실이다.
2023년에 이미 11곳의 기업이 랭킹 100위 권에 포진하면서 한국을 눌렀던 중국은 지난해에도 전년과 같은 11곳의 기업이 71억670만 달러 매출에 5.2%의 성장률로 8위에 올랐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외에 애경산업이 처음으로 100위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10위, 이들 세 기업의 총매출액은 62억8천10만 달러로 5.0%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佛(13기업), 744억$로 美(30기업·685억$) 제치고 1위 수성
로레알·유니레버·에스티로더·P&G·LVMH·샤넬·바이어스도르프·시세이도…8강은 변동없어
상위 100위에 오른 기업들의 국적은 지난해 15국가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SHEIN(4억 달러·81위)이 합류함으로써 16국가로 나타났다. 각 국가의 기업 수는 미국이 2곳이 줄고, 한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1곳이 늘어났을 뿐 나머지 14국가는 모두 지난해와 동일했다. 다만 각 국가의 100위 진입 기업은 차이가 있다.
2024년에 새롭게 100위 순위에 이름을 내민 기업은 △ 옐로우 우드 파트너스(미국·15억 달러·30위) △ 돌체&가바나 뷰티(이탈리아·9억8천450만 달러·45위) △ L Catterton(미국·9억7천400만 달러·46위) △ Shanghai Chando Group Co. Ltd.(중국·6억3천970만 달러·60위) △ Mao Geping Cosmetics Co. Ltd.(중국·5억3천960만 달러·64위) △ SHEIN(싱가포르·4억 달러·81위) △ AS BEAUTY(미국·3억7천만 달러·86위) △ 애경산업(한국·3억6천10만 달러·88위) △ Auréa Group(영국·3억6천만 달러·89위) △ Kering Beauté(프랑스·3억4천950만 달러·90위) 등 10곳이다.
리포트를 낸 WWD 측은 “2024년 전세계 화장품·뷰티 업계의 키워드는 ‘속도’와 ‘민첩성’이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이들 100대 글로벌 화장품·뷰티 기업들은 2천520억8천650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매출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
그러나 이 리포트는 사상 최대 매출의 이면에는 긴장 요인도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즉 글로벌 화장품·뷰티 기업들은 △ 지정학 측면의 긴장도 고조(국가·지역 간 전쟁과 내전 등) △ 기술 혁신 △ 복잡해진 소비자 환경 등 복합 변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 100곳 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지만 이는 2023년에 기록했던 3.8% 성장률에 비하면 성장세가 꺾인 수치다. 특히 중국 시장의 경기 둔화가 뚜렷한 영향을 끼쳤고 다수 기업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지적했다.
C-뷰티 선봉장 프로야코스메틱, 8계단 뛰어올라 28위 ‘기염’
한국, AP·LG·애경 등 랭크·국가 순위 10위…日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伊 성장 괄목
각 기업별 주목할 만한 이슈
1위 자리를 수성한 로레알은 이들 100위 권 기업 전체 매출의 18.7%를 차지하면서 소폭이지만 점유율도 확대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2019년 14.7%였던 점유율은 매년 소폭씩 증가하는 추세다. 상위 10곳 기업의 매출 합계는 1천474억9천만 달러. 전체의 58.5%를 차지했지만 비중은 하락세를 보였다.
여러 불확실성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들 톱 100 기업 가운데 73%가 매출 확대에 성공했다. 이 중 29곳의 기업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나타냈다.
다만 이는 전년도의 37곳과 비교하면 8곳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시장 전반의 성장 둔화를 시사한다. 반대로 17곳의 기업은 매출이 하락했다. 이 중 △ 7곳은 10% 이상 △ 3곳은 20% 이상 감소세에 그치고 말았다.





<WWD 발표 ‘The 2024 Top 100 Beauty Companies’ 기업별 현황: 아래 첨부문서 참조>
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흥 강자는 스페인 PUIG. 향수와 스킨케어 부문 강세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상위 10위에 진입했다. 브라질 보디케어 브랜드 ‘솔 데 자네이루’(Sol de Janeiro)의 인기 덕을 톡톡히 본 록시땅 인터내셔널은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18위에 올랐다.
중국 브랜드 중에서는 ‘프로야’(Proya)가 단연 돋보인다. 직전 년도 36위에서 무려 8단계 상승하며 28위에 올라 중국 로컬 브랜드로는 최초로 글로벌 톱 30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관련해 WWD 리포트는 “프로야 코스메틱의 이러한 대약진은 C-뷰티 브랜드의 가능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소셜 미디어에 친숙한 합리성을 내세운 가격의 색조 브랜드의 강세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시장에서 저가 브랜드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E.L.F 뷰티와 COSNOVA(독일)는 모두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 ‘뷰티 유니콘’에 등극하는 성과를 거뒀다.
리포트는 이와 함께 새롭게 100위 권에 진입한 기업 중 △ 자사 라이선스를 회수하며 급성장한 돌체&가바나 뷰티 △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Mao Geping Cosmetics Co. Ltd. △ 더바디샵의 새 주인 Auréa Group △ 자사 브랜드 ‘쉬글램’(Sheglam)으로 급부상 중인 싱가포르의 SHEIN △ 블리스 월드를 인수해 ‘로라 겔러’(Laura Geller) 리브랜딩에 성공한 AS BEAUTY에 주목했다.
반면 주식 시장에서는 화장품·뷰티 기업의 고전이 감지된 상황이다. 상장 49곳의 기업 중 주가가 오른 곳은 15곳에 그쳤다. 빅토리아 시크릿은 턴-어라운드 전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29곳은 주가가 하락했고 이 중 21곳은 두 자릿수 하락세를 겪었다.
WWD 측은 “누스킨·에스티로더·시세이도 등은 전년도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심화되며 시장가치가 더욱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분석을 내놨다.
2024년 리포트가 시사하는 내용
WWD의 이번 리포트는 화장품·뷰티 산업이 ‘고성장기’에서 ‘변동기’로 접어들었음을 예고하고 있다.
즉 우선 성장률 둔화. 시장 자체는 커졌지만 성장률은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가 글로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도 기업과 신흥 강자 간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로레알 등 기존 강자의 점유율이 견고한 가운데 PUIG·프로야·SHEIN 등 민첩한 신흥 브랜드들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대한민국의 화장품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MZ 세대의 소비 성향에 맞춘 가격 경쟁력과 디지털 전략이 성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있다. 틱톡·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친화형 브랜드의 급부상이 대표 사례라고 들 수 있다.
여기에다 화장품·뷰티 기업에 대한 주식 시장의 냉랭한 반응은 기업들이 브랜드 자산 강화뿐 아니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 재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결국 화장품·뷰티 산업은 규모의 경제에서 ‘속도와 전략’의 게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5년 이후 단순한 매출 확대보다 브랜드 정체성과 시장 민감도를 갖춘 플레이어들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러한 화장품·뷰티 업계의 전체 변화가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