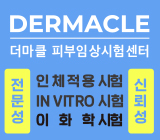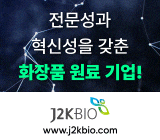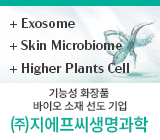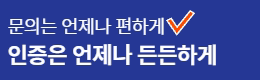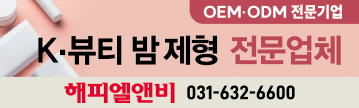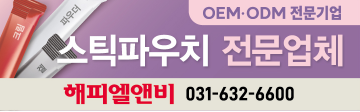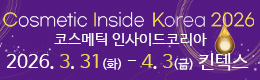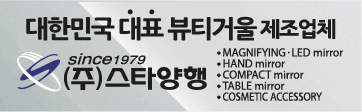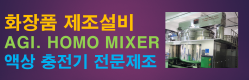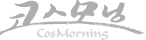지난 6월 말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한 사안을 두고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책임판매업자’에게 지우려한다는 주장과 논란이 이슈의 강도를 더욱 키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이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는 지난 2022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 민관협의체(점프 업 K-코스메틱)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에는 정책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함은 물론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 왔다. 올 하반기에도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간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현장과의 소통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계획이다.”
화장품법 개정(안)의 발의가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이슈로 이어지는 발화점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세계 화장품 수출 시장에서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3위에 올라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기업)은 이미 EU·중국·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과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법제화한다는 측면에서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다가왔을 것이라는 해석이기도 하다.
고 과장은 “지역별 간담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등 소통을 지속해 왔지만 ‘소통은 아무리해도 부족하다’라는 전제 아래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오는 △ 2027년까지 시범사업 △ 2028년~2030년까지 단계별 시행 △ 2031년 전면 시행으로 설정한 일정을 감안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제도 안착을 시도할 계획이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안전성 평가 제도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 과정에서 △ 안전성 평가사 양성 △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안전성 평가 지원 업무 전담 전문기관 지정 △ 규제 외교를 통한 국제 협력 등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점검과 확인,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규제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합리성에 기반한 규제혁신과 업계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삼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이를 넘어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출 실적과 추이를 볼 때 곧 미국을 추월해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의 자리에 오르는 일도 멀지 않아 보인다. K-코스메틱·뷰티의 무대는 세계 시장이다. 안전성 평가 제도는 ‘규제’의 의미가 아니라 글로벌 플레이어와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는 그라운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룰’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의 한 요소로서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