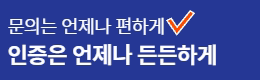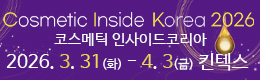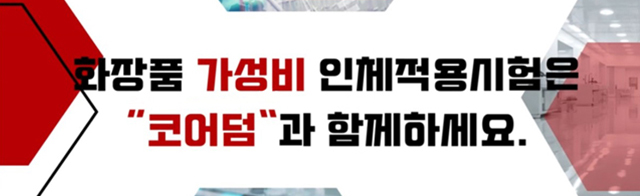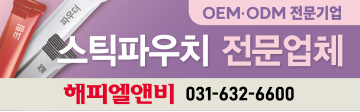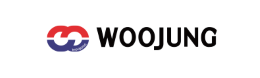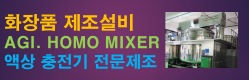최근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미국・중국・EU・일본・동남아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타오바오·큐텐재팬·쇼피) 입점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시장에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수출 국가와 유통(채널)이 확장하면서 △ 유럽의 경우 CPNP에 화장품 안전성 평가서를 작성, 등록을 진행하게 하거나 △ 환경청에 화학 성분을 등록하도록 하는 호주 △ MoCRA를 시행하는 미국 등 각 국가·지역에서는 화장품 수입 관련 법령이나 인증을 점점 강화함으로써 이에 대응해야하는 국가·지역 별 화장품 인증과 서류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럽은 화장품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을 마련해 화장품의 유통과 안전을 위해 자격을 갖춘 어쌔서(Assessor)를 통해 화장품의 개별 안전성 평가서(CPSR)를 작성, CPNP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의 첫 단계로 안전성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들을 브랜드사에서 취합해 전달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화장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① 마케팅 문안과 화장품 정보가 표시돼 있는 디자인 파일과 화장품의 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성분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② 화장품의 화학·물리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COA, MSDS 역시 제품과 원료별로 취합해야 한다.
③ 화장품 세균 오염이나 방부력을 확인 할 수 있는 PET test나 Challenge test, 유통기간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Stability test 자료도 CPSR작성을 위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④ 유럽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성분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알레르기 표시항목을 기존 26종에서 83종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IFRA나 알러젠(Allergen) 리스트도 요구하고 있다.
⑤ 내용물 이외에 포장관련 안전성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가 Compatibility test 이다.
하지만 이 서류들의 내용이 실험 데이터로 이루어진 전문성을 가진 내용이다 보니 화장품을 잘 모른다면 서류가 제대로 발급이 되었는지 조차 확인이 어렵다. <하편에 계속>
<이경아·써티 플래너스 이사· info@certiplanners.com · www.certiplanners.com >